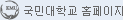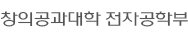국회의사당. 한국일보 자료사진
우연한 기회로 신문에 글을 싣기 시작한 지도 벌써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물론 한갓 책상물림의 글이 현실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순진한 기대로 시작한 일은 아니었다. 그저 정치를 분석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학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좀 더 가볍고 격식 없이 한국 정치라는 가상의 대화 상대에게 말을 건다는 느낌으로 어쭙잖게 지면을 채워왔다.
칼럼을 쓰다 보니 아무래도 평소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정치 현안을 살필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든 감상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허탈감 혹은 무기력감이었다. 비슷한 문제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비판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궤변과 남 탓만 늘어놓고, 이해할 수 없는 정책과 인선에 대해 변명하려는 노력조차 게을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웠다.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도 상대에게 닿지 않는 느낌, 혹은 애당초 대화할 의지가 없는 상대에게 말을 걸었다가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지는 느낌이다.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사전에 나와 있는 '염치'(廉恥)의 의미이다. 어쩌면 현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최소한의 염치가 사라졌다는 점이 아닐까 한다. 정당과 정치인이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자신의 견해만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변하고 다른 의견은 작게는 가짜뉴스, 크게는 반국가적이라고 낙인찍고, 그 모든 과정에서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이고 무절제하게 휘둘러 상대를 억누르는 것은 설령 불법이 아닐지언정 몰염치하다. 염치가 없으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벌어진다.
정치의 본질은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다만 염치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날것 그대로 충돌하지 않고 공적인 가치와 명분으로 포장될 수 있다. 공적인 가치와 명분이 사라진 정치는 그저 권력과 지위를 둘러싼 아귀다툼일 뿐이다. 제도를 통해 행위자의 욕망을 규율하는 것도 염치가 있을 때 이야기이지, 그렇지 않다면 얼마든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왜곡하여 본래의 취지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법이든 제도든 결국 승자의 손에 쥐어진 도구일 뿐이다. 결국 승자의 염치가 존재해야 패자의 승복도 가능하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
두 번째 감상은 다름 아닌 언론에 대한 실망감이었다. 물론 현장에서 한발 떨어져 있는 학자가 모르는 고충과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안과 언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는 언론의 모습에 씁쓸함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기계적 균형이라는 외형 뒤에 숨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비판적 시각과 질문은 포기하고 받아쓰기에만 열중하는 언론을 보면서 과연 한국 정치의 퇴행이 정치만의 책임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다. 몰염치한 언론이 몰염치한 정치를 부추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염치는 정치인이 타고나는 도덕성이 아니라 감시와 비판, 그리고 처벌을 통해 정치인에게 강제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게재한 콘텐츠(기사)는 언론사에 기고한 개인의 저작물로 국민대학교의 견해가 아님을 안내합니다.
※ 이 기사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