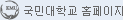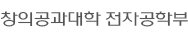언론속의 국민
| <서평>제국의 시선 / 한상일 (정외)교수 저 | |||
|---|---|---|---|
|
민본주의 그늘서 대륙경영 꿈꾼 日 진보 지식인 요시노 사쿠조
[조선일보 2004-09-03 17:52] 제국의 시선 한상일 지음/ 새물결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를 놓고 다시 한·일 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시민 사회 간의 지적·심정적 ‘소통’과 그 위에 선 연대다. 지식인은 그 소통과 연대의 이음매다. 때마침 20세기 전반 대표적 일본 지식인의 삶과 사상을 다룬 책이 눈에 띄어 반가운 마음으로 책을 집어든다. 일본 의회 민주 정치의 선구자,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이론적 지도자. 사상가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1878~1933)의 닉네임들이다. 미야기현의 상인 가문에서 태어나 센다이 제2고등학교, 도쿄제국대학 법과대로 이어진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는 1910년대 후반 소위 ‘민본주의(民本主義)’를 주창하며 일본 사상계를 이끈 대표적 지식인이었다. 특히 3·1운동을 전후한 시기, 식민지 조선 지배의 현상에 주목해 강압적 무단통치를 질타한 그의 평론들은 일본제국주의 비판론자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1919년 4월부터 1921년 2월까지 요시노가 발표한 조선 관련 논설은 무려 60편이 넘는다. 그러나 과연 요시노의 민본주의와 조선 인식은 당대 일본 식민주의의 자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일까? 이 책은 요시노로 대표되는 ‘진보적’일본 지식인들의 조선관을 통해서 일본 식민주의의 본질에 다가서려 한 의욕적인 시도다. 저자(국민대 교수)는 이미 ‘일본 지식인과 한국’(2000년)이라는 책에서 조선관의 ‘원형’으로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등을 조명하는 가운데 요시노의 사상을 검토한 바 있다. 이 책은 그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지는 심층분석인 셈이다. 책의 1부는 요시노의 사상적 궤적과 그 골격을 검토한다. 먼저 그의 종교적·사상적 스승인 신학자 에비나 단조(海老名彈正)의 종교관과 식민지 인식에서 철저한 국가주의를 읽어낸다. 요시노는 에비나의 혼고(本鄕) 교회에서 청년회를 주도했는데, 그가 편집에 관여했던 잡지 ‘신진(新人)’의 논조도 분석된다. 이어서 러일전쟁시 주전론자(主戰論者)로서 이른바 ‘7박사’의 하나였던 요시노의 학문적 스승인 정치학자 오노쓰카 기헤이지(小野塚喜平次)의 ‘중민(衆民)주의’를 소개하고 그 연속선상에서 요시노의 민본주의를 파헤친다. 영어의 ‘democracy’를 ‘민주주의’가 아닌 ‘민본주의’로 번역하여 주권의 소재를 불문에 부친 요시노는 천황(天皇) 주권론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주권의 운용에서만 민중의 의향과 복리를 강조했을 뿐이며, 5·4운동을 격발시킨 21개조 요구나 만주사변을 둘러싼 그의 중국관 속에 민본주의와 제국주의의 모순을 간파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시각이다. 2부는 이 민본주의의 사상적 기반 위에서 전개된 요시노의 ‘조선문제’진단의 논지와 그 심층에 자리잡은 식민관을 추적한다. 1916년 초 조선 시찰 뒤 총독부의 강압적인 관료주의적 통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그는 종래 ‘신진’의 기본노선과 달리 동화주의 정책에 반대했으나, 그것은 동화의 부당성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의 실현 불가능성 때문이었다. 1차 세계대전 후 민족자결의 세계사적 조류를 간파하고 이에 역행하는 정치 행태와 국민적 무관심을 비판한 것이지 동화 자체의 근본적 부정은 아니었다. 아일랜드식 ‘자치 식민지(dominion)’를 대안으로 상정한 요시노는 관동대지진 하의 조선인 학살을 치욕으로 여기면서도 식민지 지배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고, 그런 자세는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강화되었다. 요컨대 민본주의의 그늘 아래서 대륙 ‘경영’을 꿈꾼 아시아주의자, 현실주의적 동화론자, 자유주의 식민론자였다는 것이 요시노에 대한 저자의 최종 평가다. 평자도 기본적으로 이에 동의하지만, 일본 근대사에서 그만한 지식인을 찾기도 어렵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요시노의 주장에 대한 식민지 지식인들의 반응 부분이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종주국’지식인들의 자기 모순을 더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욕심이 든다. 환력(還曆)을 넘기고도 이렇게 일곱 번째 자식을 선보이는 저자의 ‘욕심’에 비한다면 못 미쳐도 한참인 후학의 넋두리다. (임성모 연세대교수·동양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