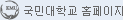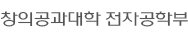언론속의 국민
| 세계 표준, 미국 표준 / 이원덕 (국제지역) 교수 | |||
|---|---|---|---|
|
우리는 세계화가 맹위를 떨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전적 정의로만 보면 세계화는 국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상품, 자본, 정보, 문화, 노동 등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류하는 이 시대의 주된 흐름을 일컫는 말이다. 만약 세계화가 국가가 지닌 힘의 강약이나 자본의 대소차이를 뛰어 넘어 균등하고도 호혜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지구촌의 개개인은 세계화를 통해 다양한 삶의 양식이나 문화를 섭렵하고 향유할 기회를 제공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화는 국제정치적 힘의 관계에 의해 철저하게 규정되고 있는 비대칭, 불균형의 일그러진 모습에 가깝다.
이 시대 세계화의 주도 세력은 뭐니뭐니해도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이다. 2차대전 직후에 이어 냉전 종결 이후 제2의 세계패권 시대를 맞고 있는 미국은 전 세계지역을 미국 자신의 힘과 자본과 문화가 통용되고 용인되는 사회로 만들려는 의욕에 불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집권과 9·11 테러사건은 미국의 이러한 세계정책을 더더욱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지금 자신의 목표에 거스르는 지구촌의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세계 정치를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화는 미국화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메리칸 스탠더드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둔갑해 판을 치고 있는 그러한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화가 진정으로 지구촌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할 수 있을까 또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 있는가 아메리칸 스탠더드가 진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보편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는 지난주부터 약 9개월간의 체류 예정으로 미국 동부의 한 중소 도시에 위치한 피츠버그 대학에 방문교수로 오게 되었는데 미국행을 전후하여 과연 아메리칸 스탠더드는 글로벌 스탠더드일 수 있는가라는 명제를 자주 곱씹어 보게 되었다. 어쩌면 미국은 글로벌 스탠더드라기보다는 오히려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미국적 예외주의)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에 가까운지 모른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지나치게 국지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지만 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 필자는 약 3주 전에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입국비자를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북새통 속에서 가족과 함께 무려 3시간을 대기하느라 짜증스러운 경험을 해야만 했다. 대기 중에도 면접호출 순번이 왠지 뒤죽박죽이어서 언제 자신의 순서가 올지 몰라 화장실도 마음 놓고 갈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비자 인터뷰 시각 예약은 물론 한달 전에 받아 놓았음에도 말이다. 수많은 나라를 다녀보았지만 최근의 미국만큼 입국이 까다로운 나라는 없는 듯하다. 또 언제나 느끼는 일이지만 미국에만 오면 미국형 도량형에 어리둥절하게 된다. 아이들의 학교 편입에 필요한 서류를 기입하려니 키는 몇 피트이고 몸무게는 몇 파운드인지를 묻는다. 일기예보는 내일 날씨가 화씨 몇 도라고 말하고 도로의 표지는 몇 마일로 표기되어 있다. 고기를 사다 먹으려니 몇 파운드가 필요하냐고 묻는다. 도량형의 국제표준이 아쉬울 뿐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하는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타 세계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인 시대에도 세계 지역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현지어의 습득은 필수적인 일이다. 또한 현지 문화에 대한 참된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는 우호 친선을 이루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미국, 미국인은 과연 세계지역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이해와 관심을 지니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세계를 지배하는 것과 지구촌 사람들의 자발적인 호감을 얻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며 질적으로 다른 일이라는 점을 미국은 깨달아야 한다. 이원덕/국민대 국제학부 교수·정치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