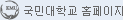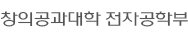언론속의 국민
| [중앙 시평] 칼을 꼭 써야 맛인가 / 조중빈(정외)교수 | |||
|---|---|---|---|
|
끝갈 데까지 가고야 마는 정치권의 활극이 또 하나의 막을 내렸다.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를 훨씬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재의결되는 것을 보는 마음은 착잡하다. 법적으로야 아무런 하자가 없다. 헌법에 보장된 대로 국회가 가진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을까? 혹시 3분의 2 이상의 표를 가지고 국회가 강자의 입장에 서서 타협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는 없었을까? 칼은 꼭 써야 맛이 아니라 차고 다니기만 해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 말이다. 지금 대통령이 국회를 뭐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나 질책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제 헌법의 기본이 되는 권력분립의 원칙은 상대방을 죽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권력을 나누어 놓기도 하고 또한 공유하게도 만들어 놓은 것이다. '특검법안'의 경험에서 본 것처럼 대통령도 입법에 참여하도록 해 놓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현실에 정착되려면 최소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 완패나 완승을 노린다면 같은 배에 타고 있으면서 상대방 쪽 배의 밑창을 뚫는 것과 같다. 이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거부한 대통령이 명분을 잃고 흔들릴 때 대통령 죽이기를 피하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고 노력해 볼 수는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그 고리를 대통령이 끊을 수도 있었다. 과반수라면 모를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 법안을 거부하는 것, 이 또한 국회를 죽이는 일이었다.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에 국회를 설득하든, 대화를 하든 그 존재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는데 그렇지도 못했다.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니 국회로서도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단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애당초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일이다. 그런데 왜들 그렇게 하지 못할까? 모두 구린 데가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자기 것은 감추고 남의 것은 조금 더 드러나게 해야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면 끝이라고 생각할수록 더 집착하리라 짐작되기도 한다. 활극의 현장은 생생한데 이미 많은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 싸움이 왜 시작되었는지, 기억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다. 기억을 되살린다고 한들 흥밋거리가 되기보다는 이미 진력나는 일이 되어버렸다. 한마디로 아무 생산성 없는 일에 온 정치권이 매달려 있고, 관객들이 외면하거나 말거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인데, '특검'이 진실을 밝힌다고 정치권에서 검은돈을 몰아낼 수 있을까? 대통령의 측근이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큰 발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금액의 다과를 막론하고, 법을 지키면서 선거를 치른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구시대의 '돈 선거 구조'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만 골몰할 때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대통령이 고백했을 때 한번의 기회가 있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먼저 털어놓고, 소위 기득권 세력을 한 테이블로 끌어들여 과거의 먼지를 털도록 유도했으면 개혁적이고 도덕적인 대통령의 이미지도 살고, 상생의 정치도 펼칠 수 있었을 것이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아직도 진실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여야가 솔직한 마음가짐으로 해법을 찾아보기 바란다. 유리한 고지에 있을 때 상대방을 밟으려고 하지 말기 바란다. 누구든 유리한 고지에 있을 때 먼저 입을 열어 상대방이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반성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과거의 치부를 들추는 이유는 누구를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길을 밝히기 위해서다. 땅을 고른 뒤 똑같이 출발하자. 조중빈 국민대 정치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