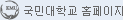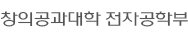언론속의 국민
| [중앙 시평] '참여'가 능사 아니다 / 조중빈 정치대학원장 | |||
|---|---|---|---|
|
2003년 7월 7일 - 중앙 - 오해 없기 바란다. 필자는 아직도 민주화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만 어느 날 갑자기 민주주의를 도둑맞은 것 같은 허탈감에 시달리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백주에 문민정부에서 말이다. 이야기인즉 이렇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렇게 상서로운 물건이 아니다. 애당초 모순에 가득찬 그 무엇이다. 복잡한 이론 집어치우고 민주주의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 너도 한표, 나도 한표 아닌가? 말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집단 최면에 걸려 있는 것이다. 예컨대 엊그제 막 스무살 된 청년의, 정치에 대해 별 관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한표하고 인생의 중년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한 몸에 느끼는 한표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 *** 앞문 열어주고 뒷문 잠근 정치 그래도 대충 넘어가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나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안전장치가 없을 수 없다. 민주주의란 기껏 해야 앞문 열어주고 뒷문 잠그는 정치다. 그게 바로 대의민주주의다. 우악스러운 1인 1표 주의를 순치하기 위한 장치라고나 할까? 그러니 대표자가 뽑힌 다음에 심사숙고(deliberation)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게 그 민주주의다. 필자가 학수고대하던 민주화는 바로 이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정당이나 의회를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를 도둑맞은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의 망령이 떠돌아다니는 것이다. 대표자들이 하도 맹탕이고, 믿을 수도 없다는 공론에 수긍할 수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참여'를 앞세우며 심사숙고를 포기하는 것의 폐해는 더욱 크다. 그 정도가 지나치면 민주주의 색깔이 확 바뀌어 버리게 된다. 점잖게 이야기해 포퓰리즘이니 뭐니 하지만, 그게 바로 인민민주주의가 된다. 인민재판이 그 좋은 예가 아닌가? "저 놈 죽여라"해서 죽여 놓고, 다음 날 "그게 아닌가 봐"라고 하면 얼마나 소름끼치는 일인가? 문민정부 포퓰리즘의 원조는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래도 그 때는 포퓰리즘이 내면화되었다기보다 전략적 선택이라는 측면이 강했다. 포퓰리즘의 구사도 기술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고, 심사숙고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본다. 그런데 작금의 포퓰리즘은 전략적 선택이라기보다 내면적 가치의 발로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것은 현 집권세력의 정권획득 과정과 관계있고,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의 특성과도 관계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민주화는 노동운동, 혹은 계급운동과 중첩해 진행돼 왔다. 권위주의 체제를 몰아내야 한다는 명제 앞에 이견이 있을 수 없었고, 시민은 승리했다.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이제 민주주의 제대로 한번 해 보겠네"하며 숨고르기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기득권 세력을 몰아내는 것만이 민주화라고 믿는 운동권이 있었다. 이들에게는 민주적 절차와 제도화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방과 분배와 평등이 문제가 됐다. 그들은 집권했고 '참여'는 그들의 양식이 되었다. 다 좋은데 만약 참여는 잘 되고 있는데 정치가 엉망이라면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는 죽어가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촛불 들고 10만명이 모이면 촛불 시위밖에 못한다. 붉은 악마 20만명이 모이면 축구 응원밖에 못한다. 네티즌이 모이면 익명성이 보장될 때 어둠의 자식이 되기 쉽다. *** 수술 잘 됐는데도 환자 죽으면 시위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네티즌이 아니라고 콤플렉스 느끼게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단연코 제동을 걸어야 한다.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도화를 통해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심사숙고하는 과정은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다. 이것이 생략되면 민주주의는 설사한다. 모두들 밖에서 빙빙 돌며 어수선하게 만들지 말고 장내로 들어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趙重斌(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약력: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미국 일리노이대 정치학 박사, 한국선거연구회 회장,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장, 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