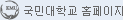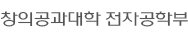국민인! 국민인!!
| [사회적기업 2.0] 웨딩드레스의 수명을 아시나요? 친환경 착한 드레스 만들어요 / 이경재(대학원 그린디자인전공 05) 동문 | |||
|---|---|---|---|
|
‘대지를 위한 바느질’ 이경재 대표 “합성섬유 드레스, 드라이 3, 4번 하면 누레져 폐기”
“웨딩드레스 수명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친환경, 작은 결혼식 문화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인 ‘대지를 위한 바느질’ 이경재 대표가 물었다. 그 이후 잠깐의 침묵. 이 대표는 말을 이어갔다. “웨딩드레스는 80% 이상 합성섬유로 만들어집니다. 대부분 대여되는데 3, 4명이 입고 나면 거의 폐기 처분되죠. 눈부신 백색을 유지하려면 한 번 입은 뒤 드라이를 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3, 4번 거치면 더 이상 대여하기도 쉽지 않아지거든요. 그렇게 버려지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로 남는 거죠.” 이 대표는 수명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 해가 되지 않는 옷을 제작한다. 회사 이름이 ‘대지를 위한 바느질’인 것도 그래서다. 그는 웨딩드레스 재료로 합성섬유 대신 자연 분해되는 옥수수 전분, 쐐기풀, 대나무, 한지 등을 쓴다. 또 일회용이 아니라 결혼식이 끝나고 장식만 떼어내면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도록 드레스를 디자인한다.
지난달 27일 찾은 서울 성북구 성북로에 있는 사옥은 작은 결혼식을 치르기에 손색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특히 크진 않지만 풀 냄새 가득한 정원이 인상적이었다. 2016년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싸게 나온 집이 있어 큰 마음먹고 단독 주택을 샀다고 한다. 이 대표는 “사실은 이게 다 빚이다. 열심히 사업해서 대출금부터 갚아야 한다”고 웃었다. ‘대지를 위한 바느질’은 몇 년 전부터 환경뿐 아니라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결혼식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성북구에서 시작한 ‘마을웨딩’이 대표적이다. 지역 내 미용실과 꽃집, 식당, 떡집 등을 이용해 결혼식을 치르는 개념이다. 동네 맛집에서 정성껏 내놓는 음식으로 차린 뷔페 메뉴는 인기 만점이다. 결혼식 비용의 70% 가까이가 지역사회에서 지출된다. 지금 사옥이 생기기 전에는 결혼식 장소로 성북구 내의 관공서 강당 등을 주로 사용했다. 이 대표는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을 하려면 꼭 강남을 거쳐야 하는 문화가 생겼다. 이를 바꿔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처음부터 환경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다. 대학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2004년 학교 졸업 후 방송사 의상실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방송국의 소모품 같은 느낌이 싫어 1년여 만에 그만뒀다. 회사를 나와 택한 건 뜻밖에 ‘귀농’이었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았던 아버지와 함께 시골 마을로 종종 여행을 가곤 했다.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도 그중 한 곳으로 10여년 전만 해도 하루에 버스가 네 대 정도 다니던 작은 시골이었다. 신대리에는 정부가 농어촌지원사업으로 지어준 마을 공동건물이 운영할 사람이 없어 방치돼 있었는데 마을 이장이 이 건물을 이 대표에게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마침 회사를 그만둘 즈음이라 그는 제안을 받아들인 뒤 공동건물을 펜션으로 꾸며 운영하며 약 4년간 농촌 생활을 했다. 숙박업 특성상 주말은 바빴지만 평일은 여유가 있었다. 대학원 과정을 알아보다가 ‘그린디자인’을 알게 됐다. 이 대표 스승이 국민대에 ‘환경과 디자인’ 과목을 개설하고 ‘그린디자인대학원’을 만들어 여러 명의 그린디자이너를 배출한 윤호섭 전 명예교수다. 대학원 공부를 하며 이 대표는 디자인에 대한 관점을 크게 넓혔다. “패선 디자이너는 트렌드나 컬러, 실루엣 등 눈에 보이는 요소에만 집중해요. 내가 디자인해서 만들어진 옷이 나중에 어떻게 폐기 처리되는지는 무관심하죠. 저도 그랬어요. ‘그저 잘 팔리는 옷만 만들면 되나’ ‘수명이 다한 옷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까’와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자이너의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고민하게 됐죠.”
그는 2008년 처음 사업자 등록을 했고 2009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제1회 소셜벤처경연대회에 참가해 서울강원권 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2010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지금까지 ‘대지를 위한 바느질’과 함께 ‘에코 웨딩’을 치른 부부는 800쌍 가까이 된다 이 대표는 그중에서도 2009년 ‘에코 웨딩’으로 식을 올린 한 부부를 아직 기억한다. 당시는 ‘작은 결혼식’이란 개념조차 생소한 시절이었다. 부부는 당시 이 대표가 만들어 줬던 웨딩드레스를 얼마 전 다시 입고 10년 만에 리마인드 촬영을 한 뒤 사진을 이 대표에게 보내왔다. 이 대표는 만감이 교차하면서도 뿌듯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이제 ‘에코 웨딩’을 지방에 정착시키겠다는 꿈을 꾼다. 지방에서는 친환경 결혼식을 하고 싶어도 이를 제대로 진행할 업체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래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켜 지방으로 보내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말 충북 청주에 ‘대지를 위한 바느질 청주점’이 문을 연다. “‘에코 웨딩’이 특별하지 않은 일상적인 결혼 문화가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이제 친환경이냐 아니냐를 떠나 누구나 친환경을 기반으로 하되 얼마나 멋지게 디자인했느냐로 실력을 겨뤄 보고 싶어요.”
원문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6290497311665?did=NA&dtype=&dtypecode=&prnewsid= ※ 이 기사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 |